Articles
- Page Path
- HOME > J Korean Acad Nurs > Volume 48(3); 2018 > Article
- Original Artic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ment to Assess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 Jiyeon Kang1, Young Shin Cho2,, Yeon Jin Jeong1, Soo Gyeong Kim2, Seonyoung Yun3, Miyoung Shim4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8;48(3):323-334.
DOI: https://doi.org/10.4040/jkan.2018.48.3.323
Published online: January 15, 2018
1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2Surgical Intensive Care Unit,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Busan
3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Yangsan
4Nursing Depar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2Surgical Intensive Care Unit,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Busan
3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Yangsan
4Nursing Depar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
Corresponding author:
Young Shin Cho,
Email: skystorysky@naver.com
Received: 5 March 2018 • Revised: 30 May 2018 • Accepted: 30 May 2018
Citations
Citations to this article as recorded by 

- Cultural adaptation and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nsive care unit Dignified Care Questionnaire (IDCQ)
Sejin Kang, So Hyun Park, Youn-Jung Son
BMC Nursing.2026;[Epub] CrossRef - Cross‐Cultural Adaptation and Validation of the Yonsei‐Social Play Evaluation Tool (Y‐SPET) for Preschool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Delphi Study
Sarah Kim, Rachelle Lydell, Sanghee Yoo, Sarah Tucker, Claudia Hilton, Ickpyo Hong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2026;[Epub] CrossRef - How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judgment and person-centered car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Mi Hwa Seo, Eun A. Kim, Hae Ran Kim, Mohammad Jamil Rababa
PLOS ONE.2025; 20(1): e0316654. CrossRef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nurses’ touch comfort evaluation scale in China
Yaohong Liu, Sainan Qiu, Hao Li, Chong Chen, Renhe Yu, Su’e Yuan
BMC Nursing.2025;[Epub] CrossRef - Factors associated with good death for end-of-life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based on nurses’ perspectives: A systematic review
Ifa Hafifah, Wasinee Wisesrith, Noraluk Ua-Kit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2025; 87: 103930. CrossRef - Impact of Interprofessional Communication and Person-centered Care on Perceived Quality of Death in Intensive Care Units by Nurses: A Cross-Sectional Study
Hye-Jin Kim, So-Hi Kw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2025; 37(2): 153. CrossRef - Trends in person-centered care research: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using text network analysis
Dajung Ryu, Hyun Su Lee, Mi Sun Ki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2025; 31(2): 141. CrossRef - Workload, Teamwork, Compassion Competence, and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among Critical Care Nurses
Hyun A Lee, Myung Sun Hyun, Jin-Hee Park, Eun Ji Seo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2025; 18(2): 14. CrossRef - A Predictive Model for Person-Centered Care in Intensive Care Units in South Korea: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unmi Kwon, Kisook Kim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2025; 37(4): 467. CrossRef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Inpatient Satisfaction in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Wards using a Healthcare Service Survey Database
Young Shin Cho, Jiwon Hong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2024; 17(3): 76. CrossRef - The Influence of Ethical Nursing Competence and Positive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n Person-Centered Care in Intensive Care Unit Nurses: A Cross-Sectional Survey
Jae Eun Lee, Hye-Young Ja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2024; 31(3): 304. CrossRef - Emotional Touch Nursing Competencies Mode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strument Validation Study
Sun-Young Jung, Ji-Hyeon Lee
Asian/Pacific Island Nursing Journal.2024; 8: e67928. CrossRef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scale for nurses
Youngshin Joo, Yeonsoo Jang, Chang Gi Park, You Lee Yang
BMC Nursing.2024;[Epub] CrossRef - Development of a cyberbullying victimization scale for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ngSerl Chun, Jinyung Kim, Serim Le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2023; 144: 106744. CrossRef - The effect of nursing work environment on slow nursing among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A descriptive study
Hyeon-mi Woo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2023; 25(2): 206. CrossRef - Birey Merkezli Perioperatif Hemşirelik Ölçeği: Türkçe’ye Uyarlama, Geçerlik ve Güvenirlik Çalışması
Nadide YILMAZ ESENBOĞA, Seher YURT
Ege Üniversitesi Hemşirelik Fakültesi Dergisi.2023; 39(1): 21. CrossRef - Comparison of Nursing Needs and Nursing Performance Perceived by Patients and Nurses in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Ward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Hee-Sun Choi, Young Shin Cho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2023; 35(3): 234. CrossRef - Factors Influencing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es in COVID-19 Special Care Units at Tertiary General Hospital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Kisook Kim, Sunmi Kw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2023; 35(2): 127. CrossRef - Moral sensitivity and person‐centred care among mental health nurse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Sun Joo Jang, Eun Hye Kim, Haeyoung Lee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2022; 30(7): 2227. CrossRef - Person-Centered Care Experience of Nursing Home Workers: A Qualitative Meta-Synthesis Study
Eun Young Kim, Sung Ok Chang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2022; 24(1): 33. CrossRef - Intersections of the arts and art therapies in the humanization of care in hospitals: Experiences from the music therapy service of the University Hospital Fundación Santa Fe de Bogotá, Colombia
Mark Ettenberger, Nayibe Paola Calderón Cifuentes
Frontiers in Public Health.2022;[Epub] CrossRef -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centred care and the intensive care unit experience of critically ill patients: A multicentre cross-sectional survey
Jiyeon Kang, Minju Lee, Young Shin Cho, Jin-Heon Jeong, Sol A Choi, Jiwon Hong
Australian Critical Care.2022; 35(6): 623. CrossRef -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ssion and Patient-Centered Care in Clinical Nurses in South Korea
Miri Jeong, Kawoun Seo
Healthcare.2022; 10(10): 2069. CrossRef - Person-centred car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A cross-sectional study
Hyuna Youn, Miyoung Lee, Sun Joo Jang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2022; 73: 103293. CrossRef -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es in Designated COVID-19 Hospitals
Hyun-Joung Yun, Jaehee Je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2022; 34(4): 413. CrossRef -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actice for Physical Restraints among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Da Eun Kim, Hye Sook Min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2022; 15(3): 62. CrossRef - Effectiveness of blood glucose control protocol for open heart surgery patients
Hye Jin Yoo, Eunyoung E. Suh, JaeLan Shim
Journal of Advanced Nursing.2021; 77(1): 275. CrossRef - Factors Influencing Patient-Centerednes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Empath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Jaehee Jeon, Seunghye Choi
Healthcare.2021; 9(6): 727. CrossRef - The Factors Affecting Person-centered Care Nursing in Intensive Care Unit Nurses
Hye Suk Kang, Minjeong Seo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2021; 14(3): 14. CrossRef - The Effect of a Multifaceted Family Participation Program in an Adult Cardiovascular Surgery ICU*
Hye Jin Yoo, JaeLan Shim
Critical Care Medicine.2021; 49(1): 38. CrossRef - Impact of Job Engagement on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The Effect of Person-Centered Nursing in South Korean Nurses
Hyesun Kim, Kawoun Seo
Healthcare.2021; 9(7): 826. CrossRef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Mi-Jin You, Hye-Sook Ha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2021; 27(3): 298. CrossRef -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erson-Centered Practice Inventory-Staff for Nurses
Sohyun Kim, Sunghee H Tak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2021; 51(3): 363. CrossRef - The Effects of th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Self-leadership on Person-centered Care Provided by Oncology Nurses
Sun-Ui Shin, Hyun-E Yeom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2021; 24(3): 174. CrossRef -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Dying and Death in Korean Intensive Care Units: Perceptions of Nurses
Haeyoung Lee, Seung-Hye Choi
Healthcare.2021; 9(1): 40. CrossRef - Influencing Factors on Performance of Person-Centered Car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 Ecological Perspective
Yein Lee, Yunhee Kim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2021; 33(5): 522. CrossRef - Factors affecting to the Person-Centered Care among Critical Care Nurses
Seunghye Choi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2020; 13(2): 36. CrossRef - Conceptualization of Person-Centered Care in Korean Nursing Literature: A Scoping Review
Ji Yea Lee, Sewon Lee, Eui Geum Oh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2020; 32(4): 354. CrossRef - Critical care nurses’ communication experiences with patients and families in an intensive care unit: A qualitative study
Hye Jin Yoo, Oak Bun Lim, Jae Lan Shim, Liza Heslop
PLOS ONE.2020; 15(7): e0235694. CrossRef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tient Version of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Questionnaire: A Methodological Study
Jiwon Hong, Jiyeon Kang
Sage Open.2020;[Epub] CrossRef - Effects of a person‐centred care intervention in an intensive care unit: Using mixed methods to examine nurses’ perspectives
Hye Jin Yoo, JaeLan Shim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2020;[Epub] CrossRef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for Intensive Care Nurses
Jiyeon Kang, Yun Mi Lim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2019; 12(2): 73. CrossRef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erson-Centered Perioperative Nursing Scale
Soyeung Shin, Jiyeon Kang
Asian Nursing Research.2019; 13(3): 221. CrossRef -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Centered Nursing and Family Satisfaction in ICUs
Jiyeon Kang, Eun-Ja Shin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2019; 12(3): 1. CrossRef - Development of the Patient Caring Communication Scale
Myoung Lyun Heo, Sook Bin I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2019; 49(1): 80. CrossRef - A Concept Analysis on Patient-Centered Care in Hospitalized Older Adults with Multimorbidity
Youn-Jung Son, Heun-Keung Yoon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2019; 12(2): 61. CrossRef - The Meanings of Hands among Clinical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Hye Jin Yoo, Eunyoung E. Suh, Yeon Hee Shin, Jung Sun Choi, Kwang Hee Park, Jung Yoon Kim, Hyunsun Kim, Jiyoung Kang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2019; 12(3): 50. CrossRef
 KSNS
KSNS
 E-SUBMISSION
E-SUB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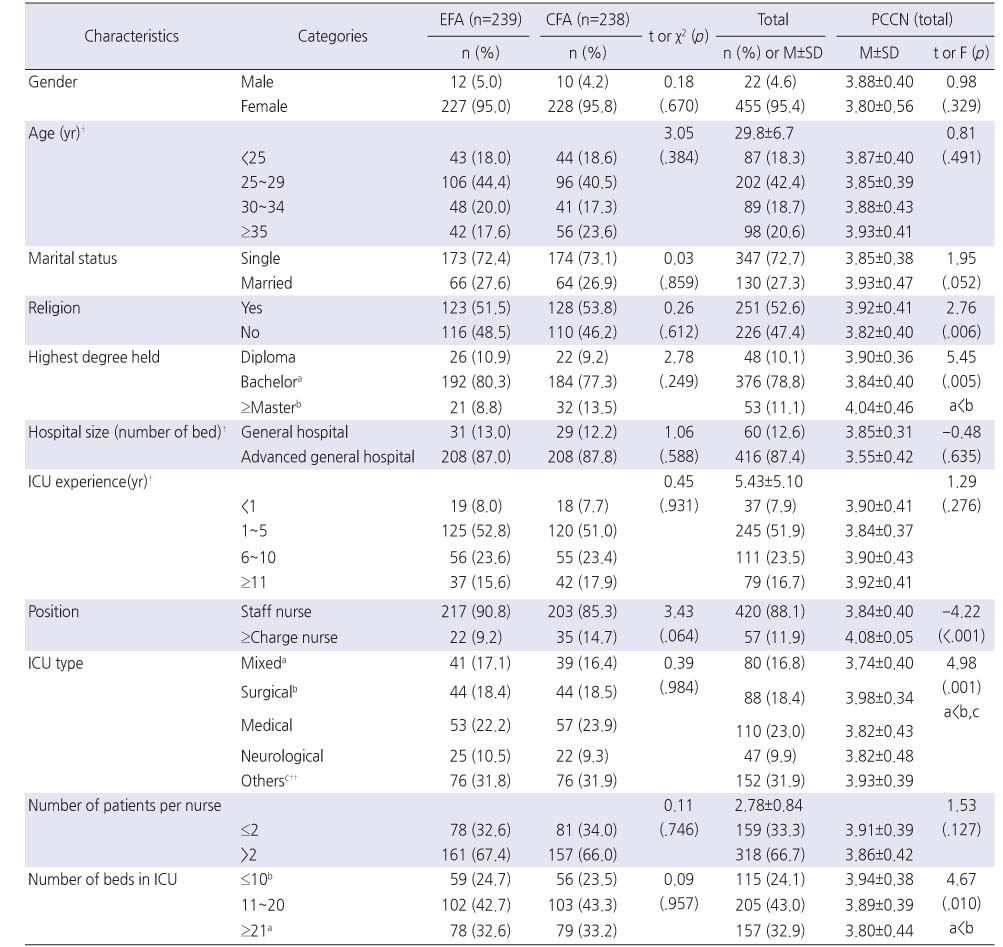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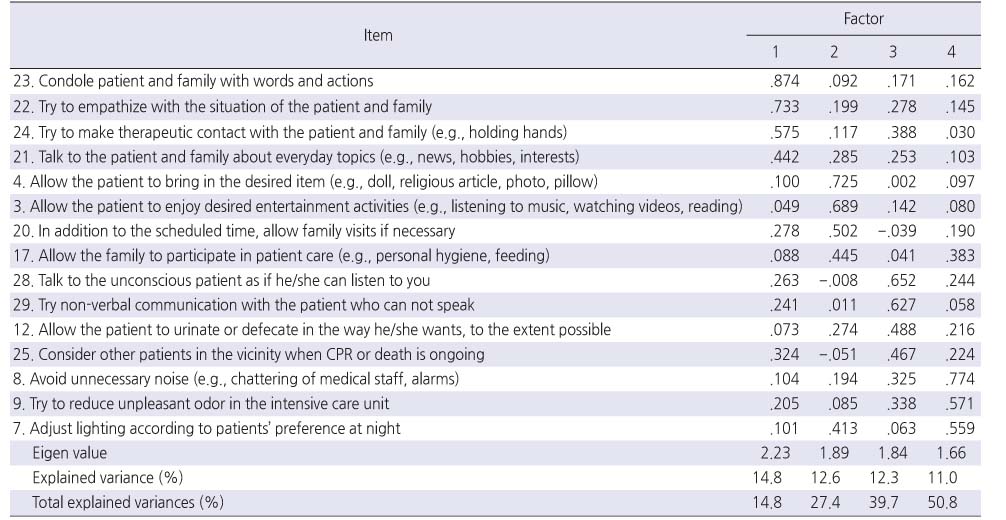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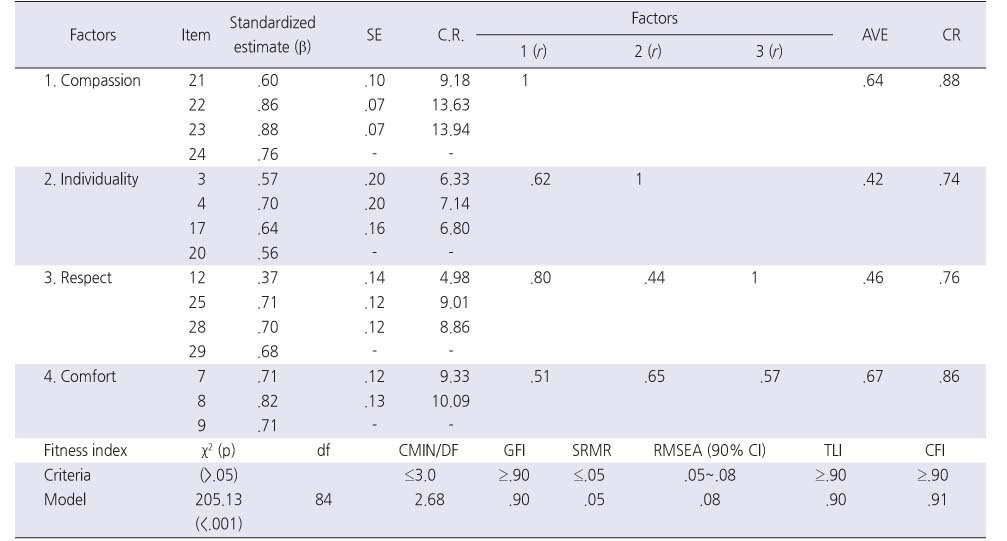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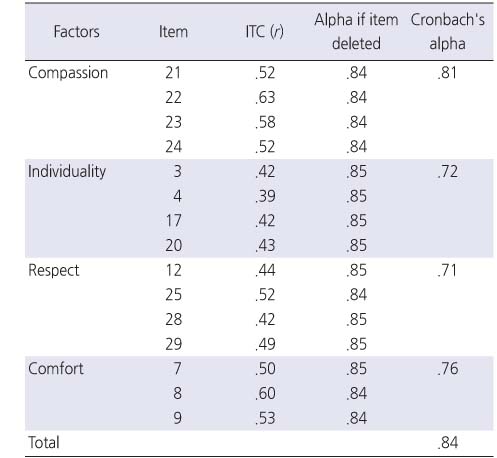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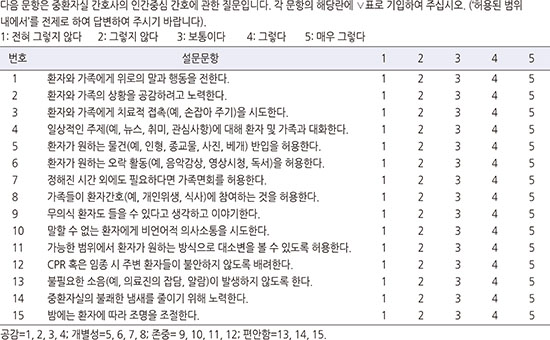
 Cite
C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