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 Page Path
- HOME > J Korean Acad Nurs > Volume 49(2); 2019 > Article
- Original Article The Effects of Breast Milk Olfactory Stimulation on Physiological Responses, Oral Feeding Progression and Body Weight in Preterm Infants
- Eun Jee Lee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9;49(2):126-136.
DOI: https://doi.org/10.4040/jkan.2019.49.2.126
Published online: April 30, 2019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Iksan, .
-
Corresponding author:
Eun Jee Lee, Tel: +82-63-850-6047, Fax: +82-63-850-6060,
Email: ejlee06@wku.ac.kr
Received: 2 August 2018 • Revised: 4 January 2019 • Accepted: 4 January 2019
Citations
Citations to this article as recorded by 

- Effect of breast milk olfactory experience on physiological indicators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a randomized clinical trial
Ling Yu, Yibo Tao, Pin Jia, Liling Li, Tianchan Lv, Li Wang, Qinqin Song, Xia Huan, Chan Liu, Yalan Dou, Yan Xuan, Xiao-jing Hu
Scientific Reports.2025;[Epub] CrossRef - Effect of Smell and Taste of Milk on Feeding Parameters in Preterm Neonates: An Updated Meta-Analysis
Sarah Alenezi, Manal Aldaihani, Sabah Alqabandi, Ahmad A Alkandari, Bader A Almukaimi, Latifah Almutairi, Mohamed Abualqassim, Ziad A Kanaan, Manaal H Ameen, Yara H Farahat, Ahmed Abu-Zaid
Cureus.2024;[Epub] CrossRef - The Effect of Breast Milk Odor on Feeding Cues, Transition Time to Oral Feeding, and Abdominal Perfusion in Premature Newborns: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Adalet Yücel, Sibel Küçükoğlu, Hanifi Soylu
Biological Research For Nursing.2024; 26(1): 160. CrossRef - Effects of human milk odor stimulation on feeding in premature infa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Yangyang Qin, Shu Liu, Yanming Yang, Yuan Zhong, Danshi Hao, Han Han
Scientific Reports.2024;[Epub] CrossRef - Family-Centered Care for High-Risk Infants and the Role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Yeo Jin Im, Young-Ah Pa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2024; 28(1): 5. CrossRef - Effect of Olfactory Stimulation of Breast Milk on Neonatal Operational Pain and Feeding: A Meta-Analysis
凤霞 侯
Advances in Clinical Medicine.2022; 12(10): 9403. CrossRef - Human neonates prefer colostrum to mature milk: Evidence for an olfactory bias toward the “initial milk”?
Magali Klaey‐Tassone, Karine Durand, Fabrice Damon, Katrin Heyers, Nawel Mezrai, Bruno Patris, Paul Sagot, Robert Soussignan, Benoist Schaal
American Journal of Human Biology.2021;[Epub] CrossRef - Olfactory Stimulation of Preterm Infants with Breast Milk
Woon Ae Lee, Jin Suk Ra
Clinical Nursing Research.2021; 30(8): 1183. CrossRef - Comparison of the Effect of Breast Milk and Sodium Bicarbonate Solution for Oral Care in Infants with Tracheal Intubation After Cardiothoracic Surgery
Xian-Rong Yu, Shu-Ting Huang, Ning Xu, Wang-Sheng Dai, Zeng-Chun Wang, Hua Cao, Qiang Chen
Breastfeeding Medicine.2021; 16(7): 568. CrossRef - The Effects of a Continuous Olfactory Stimulation Using Breast Milk (COSB) on Behavioral Stat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in Korean Premature Infants
Young Ah Park, Yeo Jin Im
Journal of Pediatric Nursing.2020; 53: e114. CrossRef -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Optimal Feeding Outcomes in the NICU
Britt F. Pados, Kristy Fuller
Nursing for Women's Health.2020; 24(3): 202. CrossRef
 KSNS
KSNS
 E-SUBMISSION
E-SUB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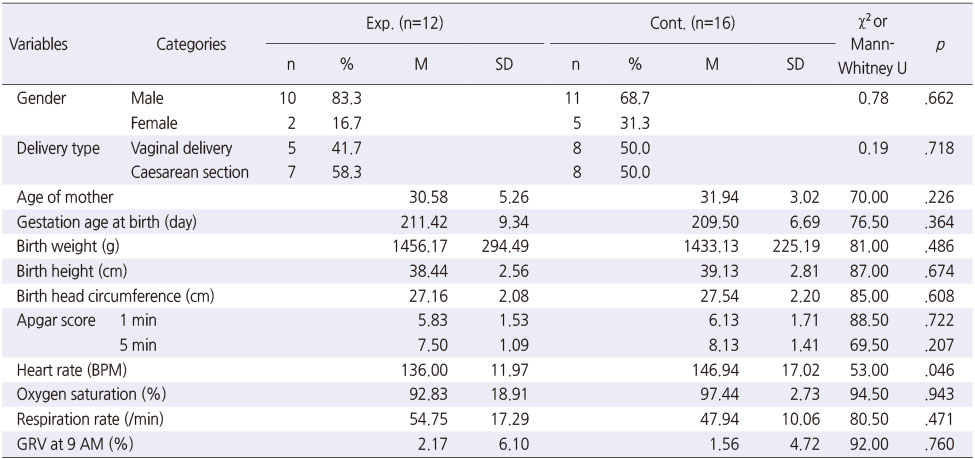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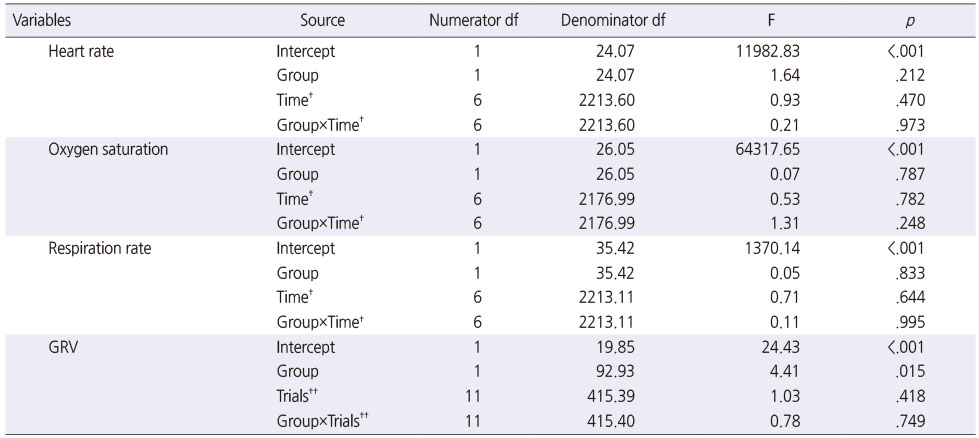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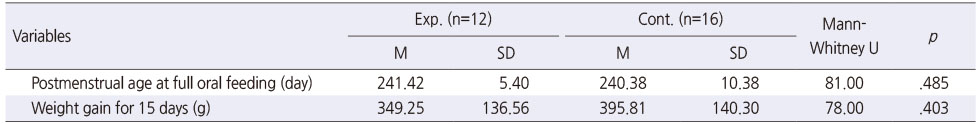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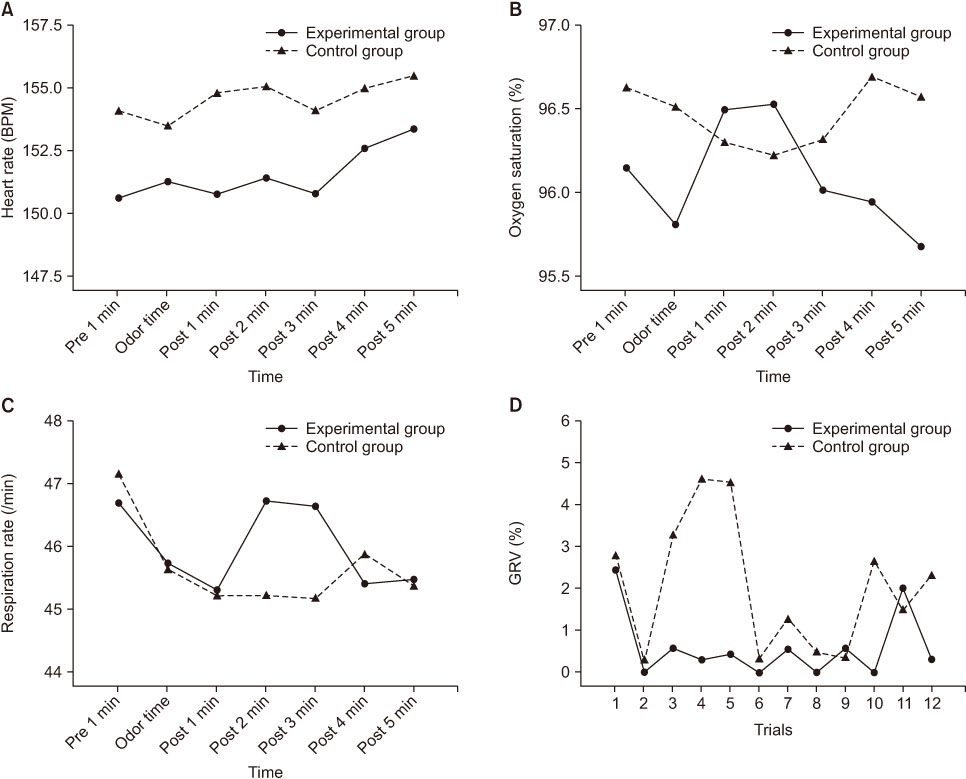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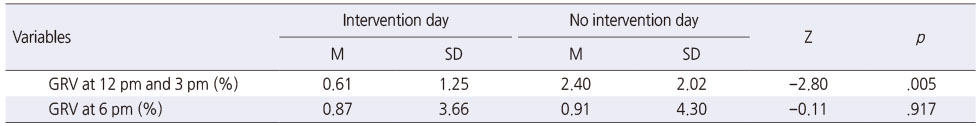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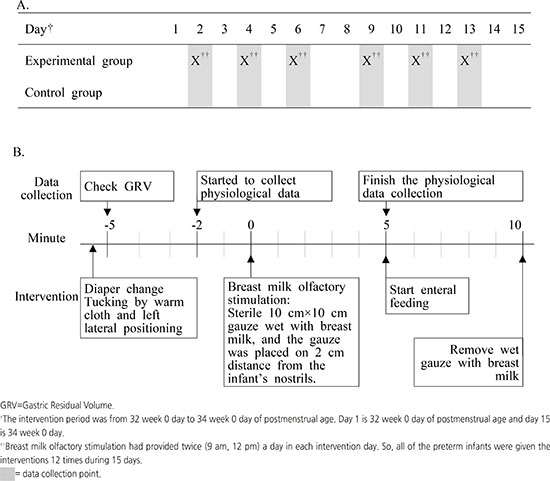
 Cite
Cite

